7월의 끝자락.
햇살은 여전히 강하고, 습도 높은 날씨에 입맛은 자꾸만 줄어드는 계절이다.
이럴 땐 시원하고 아삭한 김치 한 점이 그 어느 보약보다 낫다는 걸,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.
오늘은 여름에 제격인 알배추김치를 담갔다.
손에 익은 재료지만, 마음만은 처음 담그는 김치처럼 설레고 정성스럽게 시작했다.

🧂 좋은 재료, 정직한 손질부터
먼저 알배추를 골랐다.
크지 않고 속이 꽉 찬 배추가 좋아서, 시장에서 속노란 배추를 몇 포기 사 왔다.
배추의 잎은 부드럽고 연해서 손에 잡히는 느낌부터 다르다.
가위로 적당한 크기로 썰어낸 뒤, 천일염으로 절이는 과정은 참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.
물을 살짝 붓고 소금을 넉넉히 뿌려 골고루 절였다.
중간중간 위아래를 뒤집어주면서 배추가 너무 물러지지 않도록 시간을 잘 맞춰야 한다.
2시간쯤 지났을까, 알배추는 부드럽고 유연해졌지만 결은 살아 있었다.
그 사이에 쪽파도 한단 정성스럽게 다듬었다.
흙 묻은 뿌리를 떼고, 깨끗이 씻은 뒤 적당한 길이로 잘랐다.
양파도 한 개, 반달 모양으로 썰어 함께 준비했다.

🌶️ 양념장의 비밀은 ‘과하지 않게’
김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양념이다.
너무 맵지도, 짜지도 않게. 자극 없이 깊은 맛이 나도록.
이번 양념에는 다진 마늘, 생강, 멸치액젓, 매실액을 기본으로 넣었다.
찹쌀풀은 따로 쑤지 않고, 생배추에서 나오는 단맛으로 대신했다.
고춧가루는 두 가지를 섞었다.
색이 고운 태양초 고춧가루와, 향이 진한 중간 입자의 고춧가루.
비율은 7:3 정도.
재료들을 다 섞으니 진한 붉은빛의 양념장이 완성됐다.
그 순간만큼은 늘 기분이 좋다.
색깔도, 향도 완벽하게 나와주면 벌써 절반은 성공한 셈이니까.


🥢 조심스럽게 버무리는 시간
절인 배추를 깨끗하게 헹구고, 물기를 뺀 뒤
넓은 그릇에 담고 쪽파와 양파를 함께 넣었다.
그리고 만든 양념을 한 국자, 두 국자 천천히 올렸다.
버무릴 땐 손끝이 말을 걸어온다.
‘조금 더 무르게 절일 걸 그랬나?’
‘양념이 살짝 적은가?’
그런 순간의 감각이 김치의 맛을 바꾼다.
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레 배추를 뒤집고,
양념이 골고루 배도록 마사지를 하듯 살살 비볐다.
양념이 골고루 배고, 쪽파와 배추가 어우러지는 그 찰나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.
김치통에 차곡차곡 눌러 담았다.
뚜껑을 덮기 전, 조그만 잎 하나를 집어 맛을 봤다.
오!
맵지도 않고 짜지도 않다. 오히려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입 안을 가득 채운다.
벌써부터 내일 아침이 기대된다.
❄️ 익혀 먹을까, 바로 먹을까?
김치라는 음식은 참 재미있다.
바로 먹으면 풋풋한 생김치의 아삭함이,
며칠 두었다 먹으면 익은 김치의 시원한 맛이 매력적이다.
이 알배추김치는 바로 먹어도 좋지만,
냉장고에서 이틀 정도 숙성시키면 훨씬 맛이 깊어진다.
무르지 않게 신선함을 유지하려면 깊숙한 김치냉장고보다, 일반 냉장고 쪽이 더 낫다.
너무 오래 두면 금방 물러질 수 있으니, 1주일 안에 먹는 걸 추천한다.
🍚 이런 김치엔, 이런 밥상이 어울려
- 김치만 올린 김치비빔국수
- 삼겹살 구울 때 곁들일 김치쌈
-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과 함께
- 아니면 그냥, 갓 지은 밥에 물 말아서 김치만 한 점
먹는 순간
‘와, 이거 사 먹는 김치랑은 다르다’는 말을 듣게 된다면,
그건 이미 손맛이 완성됐다는 뜻일 것이다.
💛 내 손으로 만든 김치 한 통, 그것만으로도
김치는 대량으로 담가야만 의미 있는 음식이 아니다.
오늘처럼, 알배추 몇 포기만 정성 들여 담가도
그 속엔 집을 지키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다.
누군가에게 줄 것도 아니고, 판매용도 아니다.
그저 가족과 나를 위해, 지금의 식탁을 조금 더 맛있게 만들고 싶었을 뿐.
이렇게 담근 김치는 내일의 밥상 위에서 가장 빛나는 반찬이 될 것이다.

🫓 조금 남은 알배추로, 고향의 맛을 부쳐보았다

김치를 담그고 남은 배추 몇 장.
그걸 그냥 두긴 아까웠다.
그래서 부침가루 반죽을 풀고,
달궈진 팬에 노릇노릇하게 부쳤다.
강원도에서 나고 자란 나에겐 ‘배추부친개’가 바로 고향의 맛이다.
어릴 적 겨울 저녁, 아궁이에 불 피워놓고
엄마가 부쳐주던 배추전은 별다른 재료 없이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.
겉은 바삭하고, 속은 부드럽고,
배추의 단맛이 고소한 기름과 어우러져 입안 가득 퍼지던 그 감동을
지금도 잊을 수 없다.
이렇게 김치도 담그고, 부침개도 부쳐 먹으니
마치 고향집 부엌에 앉아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.
음식이란, 맛보다 먼저 추억이 다가오는 것같다~^^
오늘도 저의 블러그에 찾아와주시고
특별한것 없는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^^
행복하시구요 구독과 공감 꾹~~ 눌러주세요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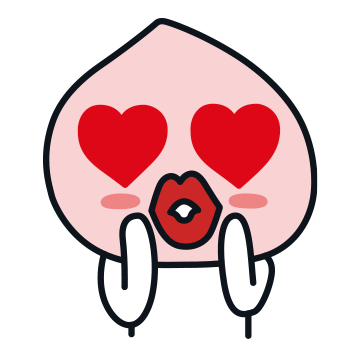
'사라의 하루기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🍚 퇴근 후 집밥이 가장 맛있는 이유|하루를 위로하는 집밥 이야기 (1) | 2025.11.07 |
|---|---|
| 🦀 혼자 보내는 명절 이야기|외롭지 않게 보낸 하루의 기록 (0) | 2025.09.29 |
| 🎬컨저링: 마지막 의식 영화 후기|공포와 여운이 남은 관람기 (0) | 2025.09.07 |
| 주말농장 일기🌱 작은 밭에서 피어난 오늘의 기록 (4) | 2025.06.09 |